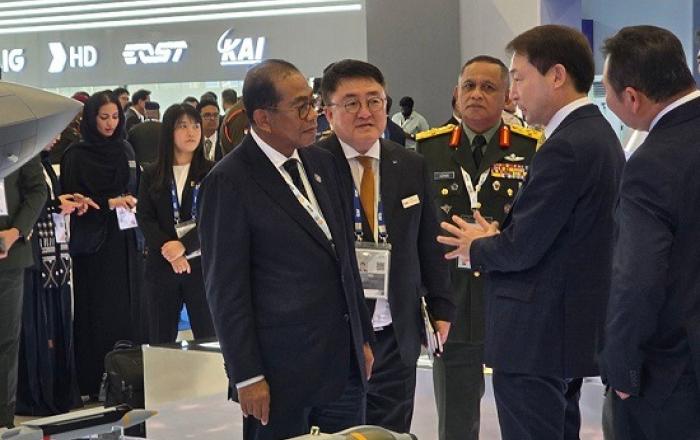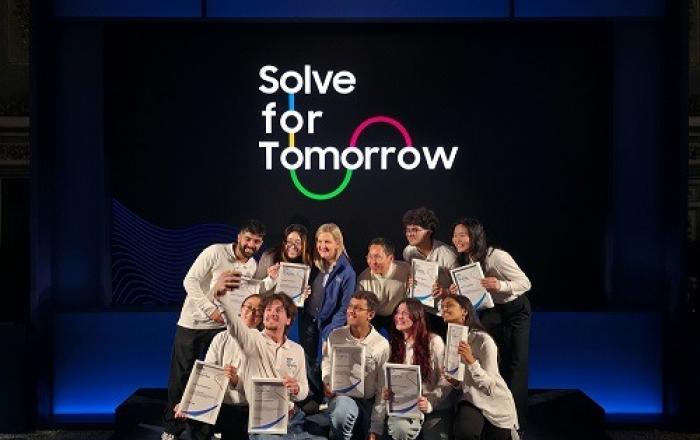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다. 황제펭귄은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 바다가 얼기 전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맥머도(McMurdo) 남극기지 인근에서 자주 관측되는 점에 착안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기후 위기와 서식지 파괴로 점점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남극을 대표하는 황제펭귄은 현재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종(Near Threatened)’으로 분류돼 있으며, 주요 위협 요인은 기후변화와 어업 활동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이 줄어들며 주요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어 황제펭귄의 번식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WWF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시민과학 이니셔티브 ‘펭귄 워치(Penguin Watch)’와 시민과학 플랫폼 ‘쥬니버스(The Zooniverse)’와 협력해 펭귄 개체 수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MPA) 지정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등 다양한 보전 활동을 이어가며, 펭귄의 서식지와 먹이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먹이 찾아 50km, 알 품고 2개월…기후 위기로 흔들리는 펭귄의 일상
황제펭귄은 키가 약 115cm에 달하는 펭귄 중 가장 큰 종으로, 짝을 이루면 평생 함께하며 번식과 육아를 함께 책임진다. 암컷은 알을 낳은 뒤 바다로 나가 최대 50km를 이동해 물고기, 오징어, 크릴 등을 사냥하고 새끼를 위해 다시 돌아온다.
그 사이 수컷은 알을 발 위에 올려 ‘육아 주머니(brood pouch)’라고 불리는 깃털로 덮인 피부로 감싸 알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 두 달간 수컷은 먹지 않고,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알을 지킨다.
부화 후에는 암컷이 위 속에 저장한 먹이를 토해 새끼에게 먹이며 육아를 이어가고, 수컷은 다시 먹이를 찾아 바다로 떠난다. 여름이 찾아오는 12월, 해빙이 갈라지며 바다가 드러나고, 어린 펭귄들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다[1].
그러나 기후변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황제펭귄의 번식지와 먹이 사냥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제펭귄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번식 실패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냥도, 허들링도… 남극에서 사라지는 황제펭귄의 생존 기술
남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황제펭귄은 수중에서 평균 200m, 최대 565m까지 잠수하고 20분 넘게 머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 조류다. 사냥 능력과 집단 생존 전략 등 다양한 적응 기제를 발휘하며 수천 년간 남극의 극한 자연에 적응해 살아왔지만, 해빙의 감소로 주요 먹이인 크릴과 오징어가 줄어들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황제펭귄은 남극 생태계의 먹이사슬 중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수가 최대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제펭귄은 ‘허들링(huddling)’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군집을 이뤄 체온을 유지한다.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 수천 마리의 펭귄이 서로 몸을 밀착해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무리의 안쪽으로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2]. 이렇게 밀착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극한의 환경에서 중요한 생명 유지 수단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충분한 수의 펭귄이 모여 허들링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존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